[독도이야기88] 섬 전체가 천연 기념물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덕분에 독도는 인간에 의한 환경 훼손이 심하지 않아 해양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다.
우선 독도의 기후는 해풍이 심한 해양성 기후이다. 연평균 기온이 12℃의 해양성 기후로 1월 평균 기온이 1℃, 그리고 8월의 평균기온이 23℃이다. 연평균 강우량은 1,400mm이며, 연중 맑은 날은 겨우 47일, 흐린 날은 168일, 비오는 날은 86일, 안개 낀 날 60일 등 대부분의 날이 흐리다.
연근해의 표면수온은 3~4월에 10℃ 정도로 가장 낮고, 8월에는 25℃이다. 한류인 북한 해류가 이 섬 부근에서 돌고 있다. 난류인 쓰시마해류는 더 북상하여 선회한다. 표면수의 염분농도는 33~34%로 비교적 높고, 표층 산소량은 6.0㎖, 투명도는 17~20m로 상당히 맑은 수역이다. 여기에 한?난류가 교차하며, 플랑크톤이 많은 천혜의 조건을 갖춰 회유성 어족 자원이 풍부하다.
따라서 섬 주변에는 전복, 소라, 미역, 김, 잡어 등 수자원이 풍부하여 동해 어민들의 출어장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독도의 황금어장은 일본이 끊임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30~40년 전만 해도 독도에는 강치(물개, 바다사자와 비슷한 동물로 식육목(食肉目) 강치과에 속하는 포유류)가 많이 서식하고 있었으나 사람들의 접근과 일본인들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
바다 밑에는 수많은 다랑어 떼와 혹돔, 망성어 등이 자유롭게 노닐고 있다. 1987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독도연구회’ 조사결과 이제껏 울릉도 근해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해조류인 대황의 대량 서식이 밝혀지기도 했다.
해양 무척추동물은 산호의 강장동물 1과 1종, 전복, 밤고동, 소라 등 연체동물 9과 19종, 바위게, 부채게 등 절지동물 11과 17종, 불가사리, 성게 등 극피동물 5과 5종 등 모두 26과 42종이 조사, 보고되고 있다. 이중 전복과 소라, 게는 독도에서 가장 중요한 수산자원으로 꼽힌다.
독도의 해양 생물상에 대한 연구가 처음 진행된 것은 지난 1981년. 서울대 이인규 교수(식물학과)는 독도의 해조식생이 북반구의 아열대지역이나 지중해 식생형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독도를 별도의 독립생태계 지역으로 분할하자고 주장했다.
그뒤 본격적인 조사연구는 1990년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고, 현재 ‘섬연구회’, ‘자연보호중앙협의회’, ‘독도연구보전협회’ 등에 의해서 활발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1년 6월 ‘섬연구회’는 독도 근해의 해양세균, 식물플랑크톤에 의한 기초생산력, 해조군락, 연체동물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독도 근해의 식물플랑크톤 일차 생산력은 속초나 포항과 같은 연안에서 측정된 수치와 비슷했다. 해조류는 총 43종이 채집되었으며, 녹조류 5종, 갈조류 16종 및 홍조류 22종이었다. 1995년 여름조사에서는 녹조류 18종, 갈조류 32종, 홍조류 115종 등 모두 165종의 해조류가 조사됐다.
독도는 강한 해풍과 암석류의 척박한 토질을 갖고 있어 식물이 자라기 힘든 땅이다. 독도의 식물은 바위틈에서 어렵게 생명을 유지하는 풀이 대부분이다. 그래도 서도에서 갯강활로 보이는 풀 등 식물 3종이 발견되었고, 남방식물인 번앵초도 많이 보이고 있다. 흰 꽃을 피우는 섬패랭이도 많이 발견됐고, 용화떼로 불리는 2㎡ 가량의 호장은 다년생 풀이다.
동도에서는 그 중턱에서 섬괴불 나무 32그루가 가냘픈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동도의 사철나무는 육지의 것보다는 잎이 크고 둥근데, 분화구 사면에 몇 그루가 자라고 있다. 또한 1989년부터 푸른독도가꾸기모임에서 심은 동백, 해송 등 800여 그루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현재까지 독도에는 소나무과, 노랑덩굴과, 장미과 등 목본식물 3종과 명아주과, 비름과, 질경이과, 섬 괴불나무, 해송, 왕거미풀 등 초본식물 50여 종이 자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쥐명아주, 번행초, 갯패랭이꽃, 대나물, 가는기린초, 붉은 가시딸기, 무룬 나무, 구절초, 참김의털, 달뿌리풀, 노간주비짜루, 날개하늘나리 등은 울릉도에도 없는 풀들이다.
독도에 서식하는 주요 해조류(바다새)는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등이다. 괭이 갈매기는 텃세이며 슴새와 바다제비는 여름 철새로 3종이 모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있다. 하지만 슴새는 그 수가 급격히 줄어 현재는 발견하기 어렵다. 반면 바다제비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괭이갈매기도 동도의 서쪽과 남쪽의 암벽에 집중 번식하고 있다. 이들 조류는 동북아시아 일대에서만 번식하고 있어, 정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1982년 11월 16일 독도를 천연 기념물 제336호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했다.
독도의 곤충상은 다른 도서지방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최초로 곤충상이 보고된 것은 프랑스 곤충학자 쥴리베(Jolivet?1974)에 의해서다. 쥴리베는 독도에서 긴발벼룩잎벌레(Longitarsus succineus Foudras)(발표 시 학명:독도잎벌레: ongitarsus amiculus Baly)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는데, 표본의 채집경위 또는 그 출처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 후 1981년 한국자연보존협회에서 주관하는 울릉도 및 독도 종합학술조사에서 7(8)목 26과 35속 37종이 기록되고 있다.
1996년 자연보호중앙협의회가 주관한 종합학술조사에서 1목 9과 13속 16종이 새로 추가되어, 모두 9목 35과 48속 53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독도에서 기록된 곤충들은 잠자리목 2종, 집게벌레목 1종, 메뚜기목 2종, 노린재목 9종, 매미목 8종, 풀잠자리목 1종, 딱정벌레목 15종, 파리목 8종, 나비목 7종으로 딱정벌레목 곤충이 28.3%로 종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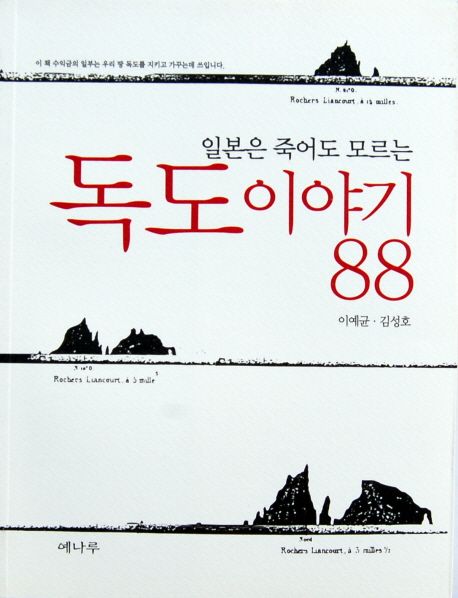
※ 저작권자 ⓒ 헤럴드 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